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랑하는 관세에 대한 비판으로 자주 등장하는 논리는 서로 각자 잘하는 분야를 담당해 자유롭게 거래(무역)하면 세계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고 다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즉,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 자원 배분' 혹은 '비교우위' 이론이다. A와 B가 있다면, B는 사실 모든 방면에서 A보다 능력이 없어도 둘 다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 나중에 서로 교환하면 이득이 된다. 교과서에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것이 빌 게이츠와 비서 이야기인데, 사실 비서 입장에서 들어보면 뭔가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 씁쓸함이 가시기 어려운 부분이 남는다.
그렇다. 빌 게이츠는 뭐든지 다 잘하는 천재이고, 시급이 수억 원 넘는 분이니 그분이 타이핑을 치거나 직접 커피를 내리며 시간을 소모하시는 것은 실로 이 세상의 비극이 아니겠는가. 비서는 그저 수십억 지구인의 정보통신 문명을 선도하시는 회장님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열심히 복사를 하고 탕비실에 과자를 채워 넣으면 분수에 차고도 넘치는 것이다. 빌 게이츠 비서 출신으로 세계 5위 부자에 오른 스티브 발머를 보라. 위대한 스승 밑에서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니 그저 감읍, 영광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영원히 비서 자리에 만족할 수는 없다. 의욕 있는 사람은 새벽 공부를 해서라도 역량을 발전시켜 나만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은 열망에 불타오르기 마련이다. 죽을 때까지 남 수발만 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시던 사장을 뛰어넘어 내가 나중에 더 잘 될 수도 있다. 스티브 발머는 비서로 시작했지만 2000년 빌 게이츠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물려받아 제2의 도약을 성공시켰고, 현재 배당금으로만 연 1조 원이 넘는 돈을 받는다. 사실 오랜 세월 한솥밥을 먹은 게이츠와 발머의 이야기는 드문 케이스이니, 훌륭한 2인자의 이야기도 좋지만, 회사를 박차고 나가 성공한 창업인들의 인생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많은 영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
다시 말하면, '비교우위'는 본질적으로 역동적(Dynamic)이다. 개인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다. 내년에 250주년을 맞는 미합중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은 일견 형식상 독립은 했으되, 담배·사탕수수·목화 등 농산물과 원자재만 영국으로 수출하고, 첨단기술 제품과 온갖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패턴이 고착화 즉, 플랜테이션 국가로 전락할 것을 깊이 우려했다. 그래서 그를 비롯한 연방주의자들은 신생 공화국이 매우 높은 관세율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실제 미국의 산업화에 높은 관세율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주장 역시, 전적으로 부정하긴 어렵다.
영국과 서유럽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올린 것뿐만이 아니다. 2019년 출간한 톰 니콜라스(Tom Nicholas)의 책, 'VC: An American History'를 보면 미국 스타트업 성공 신화의 원조는 사실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고려 시대 문익점이 목화씨를 숨겨왔듯 영국의 방직 기술을 훔쳐 만든 직조 공장이었다. 오늘날 경제성장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말하듯, 일본은 미국을 베끼고, 한국은 일본을 베끼고, 중국은 한국을 베끼는 성공방정식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미국이 유럽을 베낀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 최고의 두뇌들을 공수해 원자탄까지 만들지 않았던가.
한국과 중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남에게 의존하던 것, 역량이 없다고 무시당하던 분야에서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적을 일궈낸 즉, 존재치 않던 '비교우위'를 어떤 수단을 쓰든지 창출해 내온 피와 땀이 얼룩진 세월로 인해 오늘이 있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비교우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자칫하면 다시금 경제적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다. 경제학 교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세계 전체의 분업 구조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옛날처럼 하는 게 '윈윈'이라고 반박하는 주장에는 아예 한가한 소리라며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이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의한 '세계 전체의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업 구조'를 향한 초국가적 대타협이 실현되거나,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만이 반도체 제조를 제일 잘하니, 비교우위가 없는 삼성전자와 인텔은 오늘부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걸까. 이제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를 가장 싸게 만들 수 있으니 현대와 포드는 공장을 팔아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비교우위'는 순수한 개별 기업과 국민의 노력인가, 아니면 WTO가 표방하는 '자유무역'의 구호 아래 정부가 뒤에서 쌈짓돈을 쥐여 주었기 때문일까.
모든 나라들이, 서로 정직하고 자유롭게 교역하며 인력이 넘나드는 세상은 분명 모두가 원하는 미래다. 진시황도 비슷한 꿈을 가졌던 듯 하다. 어쨌든, 미중 신(新)냉전과 트럼프의 '상호관세'로 우리는 그간 마주할 필요가 없었던 국제정치의 민낯을 바라보고 있다. 세상은 이제, 혹은 원래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다. 새삼스럽지만, 미국의 독립 당시 인구는 300만 명, 동시대 중국 청 왕조 인구가 3억 명 가량이었다는 사실을 음미하게 된다. 4월 2일 이후, 우리는 국제 분업 구조 '새판짜기'의 승자가 되어 확장하고 융성하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름다운 이상에 매몰되면, 당위를 앞세우기 마련이니 실익은 적고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기 쉽다. 고통스럽지만 비정한 현실 논리를 수용한다면, 지금 한국의 패는 나쁘지 않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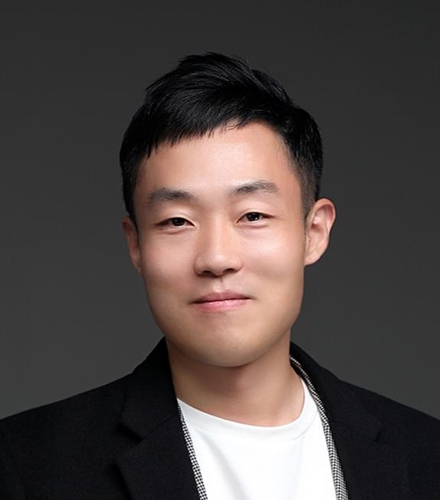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